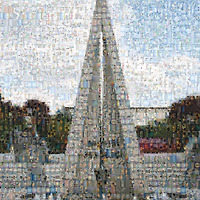노(老)스님이 몽둥이를 들고 제자의 머리 위로 흔들며 말한다. “이 몽둥이가 있다고 해도 너는 맞을 것이고, 이 몽둥이가 없다고 해도 너는 맞을 것이다. 만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너는 맞을 것이다. 이 몽둥이는 있느냐, 없느냐?”
질문은 답을 구속한다. 질문은 답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물을 수 있는 자와 답해야 하는 자를 경계 짓고, 이 경계는 권력의 작동과 함께 영속화된다. 아담과 이브는 신에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감히 물을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먹는 것, 곧 힘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질문자와 답변자의 위치를 스스로 벗어남으로써 그들은 질문이 구획해 놓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견고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신은 조급해하며 묻는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정치의 영역 또한 다르지 않다.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 위에 구축된 공공성의 영역이 애초에 파국의 증상을 내포하고 있다면, 즉 아우슈비츠가 광기어린 역사의 한 국면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속에 필연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회의 진보는 아감벤의 말처럼 “환상과 변명”에 불과할 따름인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확립한 합의의 정치가 그 근저에 폭력과 배제의 역사를 담지하고 있는 한, 정치는 다만 형식적 절차로 축소된 채 그 안에 있는 숱한 목소리들을 침묵하게 만들 뿐이며, 이 목소리들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는 “벌거벗은 생명” 그 자체로 전락하고 만다. 여기서는 묻는 이와 답하는 이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살만한 삶을 규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곧 국가다. 주변인으로서의 삶은 푸코의 말대로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근대적 삶-권력에 포획되어 자신의 인간적, 정치적 기원을 말소당한 채 삶을 연명할 뿐이며, 이는 정규직이라고 비껴갈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현재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치를 발본할 수 있는 다른 민주주의의 창안, 곧 새로운 질문의 가능성이다.
이주노동자, 철거민, 난민, 성 소수자 등 이들은 목소리 없는 자들이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존재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과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더욱이 ‘내’가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나’ 또한 잠재적 잉여인간으로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제 묻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너’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대의한다는 ‘너’의 기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쩌면 질문만으로 변하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잠재적이자 근원적인 시작점인 것이다.
이제 노스님의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스님, 하늘이 참 맑습니다.” 화두(話頭)
편집장 박승일
'편집장의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3호] 연애, 열애, 열외 (0) | 2012.02.16 |
|---|---|
| [112호] 공-간 空-間, 비우고 띄우다 (0) | 2012.02.15 |
| [111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다 (0) | 2012.02.11 |
| [110호] 대학원, 낯설다 (0) | 2012.02.11 |
| [108호] 소통을 허하라! (0) | 201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