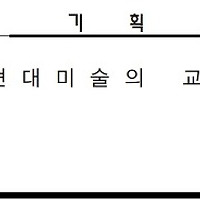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매스-미디어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방출하는 시각 이미지, 특히 사진과 동영상으로부터 전달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 문맹에 대한 문자 리터러시 교육과 마찬가지로 시각 문맹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해졌다. 리터러시(literacy)라는 말은 원래 1492년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 이후 문자로 읽고 쓸 수 있는 문식력(文識力)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사진과 영화의 출현 이후 20세기 후기 정보 산업시대 영상매체의 급진적 발전, 특히 디지털 매체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사진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으로서의 비주얼 리터러시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코드를 매개로 하는 문자 리터러시
언뜻 생각하기에 사진을 만들고 이해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이용자들이 사진을 통해 실행하는 리터러시는 아직도 문자 리터러시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드는 사진은 일방적으로 텍스트를 전달하는 발신기호로 이해되고, 그들이 수용하는 사진은 일종의 암호해독과 같은 텍스트 구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자 리터러시는 소통의 실체로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형성된 코드(code)를 매개물로 한다. 이러한 코드들은 기호학적으로 보편성을 근거로 하는 상징(symbol)의 영역에 속한다. 이 신호들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상호 소통하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발신기호가 된다. 기표와 기의를 근거로 하는 언어학적 텍스트와 그 이데올로기적인 분석, 그리고 특정 상품을 위해 만들어진 광고는 문자 리터러시를 필요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비주얼 신호들이다.
문자 리터러시의 구조는 또한 광고, 포토저널리즘, SNS 영역에서 특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소통사진에서 잘 나타나다. 이러한 사진들은 공통적으로 언어학적인 구조와 같은 분명한 의미(connotation)을 가지는데, 이를 흔히 상징-이미지(symbol-image)라고 한다. 상징-이미지는 사진을 만드는 작동자에게 일반적 메세지를 전달하는 개념적 도구, 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학습된 장치(dispositif)로서 이해된다. 게다가 이미지를 수신하는 수용자 역시 주체-장면(subject-spectrum)의 분석적인 방식으로 이미지에 함축된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이 경우 사진 읽기는 수용자 자신의 경험적인 인상을 배제하면서 언제나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보편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비주얼 리터러시
그러나 사진 이미지의 올바른 이해는 열린 해석의 지평으로 이해되는 비주얼 리터러시로부터 온다. 사진의 실질적인 메시지는 이미지가 외시하는 상황 그 자체, 즉 구조 없는 텍스트로서 탈-코드(sans code)가 되고 기호학적으로 지표-이미지(index-image)가 된다. 지표-이미지는 멀리 산 위에 피어나는 연기나 누군가 지나간 발자국과 같이 어떤 존재의 자국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는 사진은 바로 이러한 연기나 발자국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진은 연기와 같은 단순한 물리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인접성(contiguïté), 게다가 존재론적으로 작동자의 특별한 경험을 암시하는 감성적인 자국(trace)으로 이해된다. 이럴 경우 사진읽기는 제시된 장면이 수용자 자신의 경험적인 상황으로 전이되면서 언제나 “무엇을 지시한다”라는 연극적인 구조(the photographic)를 가진다.
사진 이미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비주얼 리터러시는 코드를 근간으로 하는 문자 리터러시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사진을 이데올로기적 혹은 문화적으로 학습된 장치가 아니라 관찰자의 특이한 상황을 지시하는 지시소(deictique)로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진적 행위의 다변화된 관점에서 관찰자의 1인칭 마이크로 시각(micro vision)을 가지게 하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유통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사진이나 자기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에서 잘 나타난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사진미학의 탈-구조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비주얼 리터러시의 특징들은 또한 사진적 행위(acte photographique)의 발신과정과 수신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나타난다. 우선 사진적 행위의 발신과정에서 사진을 생산하는 주체-작동자(sujet-operator)의 관점인데, 이는 사진을 만드는 과정으로 대상과의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순간까지 촬영자 자신의 1인칭 관점을 말한다. 이때 생성되는 사진은 근본적으로 촬영자 자신의 개인적인 의도에 관계되며 기호학적으로 “물리적 연관 관계”를 가지는 지표(index)로 이해된다. 이 말은 곧 사진은 촬영 행위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촬영자 자신의 특별한 의도를 반영한 결과를 말한다. ‘특별한 의도’란 철학용어로 생성(genèse)을 말하는데 흔히 행위 이전에 이미 내재된 존재론적 충동이나 욕구에 관계하고, 이러한 생성이 사진으로 드러난 것을 자동생성(genèse automatique: 앙드레 바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필립 뒤봐는 “사진은 그 사진을 있게 한 원인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주체-관객(sujet-spectateur) 관점에서의 이미지 수용
본래 주체-작동자의 1인칭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담론과 코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관찰일 뿐이다. 주체-작동자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보는 신기한 세상일 수도, 처음으로 사랑의 환희를 경험한 연인들의 세상일 수도, 혹은 소외되고 고독한 이들이 바라보는 암울한 세상일 수도 있다. 자신이 바라본 세상으로 대상을 촬영하는 것, 그것은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촬영된 이미지가 비록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 실행의 원인은 적어도 자신의 내적 지향성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선택된 대상은 그것에 대한 존재론적 지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촬영을 할 때 기억도 경험도 하지 않은 관념의 향연에 빠져있다. 여기에는 오로지 즉각적인 앎의 반사만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매일 수많은 파스텔의 색을 보고 학교를 다니지만, 정작 교실에서 배우는 색은 무지개 원색뿐이다. I like의 감정과 I love의 감정을 잘 알지만, 실제 이 두 감정의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함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불현듯 수많은 결정적 순간(instant décisif)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집단이 만든 관념의 원색들과 위선적인 개념들, 그리고 한 순간 사라지는 유희들뿐이다. 작가들조차도 자신의 경험이 아닌 대중매체가 만든 트렌드를 촬영하며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결국 순수예술로 위장된 대중예술의 두 얼굴만 존재할 뿐 어딜 봐도 자신의 얼굴은 없다. 오늘날 만연한 예술의 주체부재에 거슬러 촬영자 자신이 바라 본 세상을 드러내는 사진적 행위, 바로 여기에 진정한 사진예술이 있다.
사진의 올바른 비주얼 리터러시는 또한 주체-관객(sujet-spectateur)의 관점에서 이미지를 수용하는 수용자 자신의 열린 상상과 기억에 있다. 이럴 경우 사진읽기의 실질적 주체로서 주체-관객은 단순히 이미지를 관찰하는 구경꾼이나 상황을 재구성하는 기억의 산보자가 된다. 물론 사진은 즉각적으로 학습된 앎과 문화적 코드, 그리고 논리적 기억이 만드는 끝없는 관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학습된 해부학적 인지에 불과한 것이며 주체-장면이 강요하는 일방적인 해석과 이데올로기적인 폭력이 될 뿐이다. 엄밀히 말해 사진은 응시자로 하여금 관객의 기억과 상상을 자극하는 자극-신호(signes-stimulis)가 된다. 왜냐하면 사진은 실제 3차원적인 대상이 2차원적인 빛과 그림자로 이동된 물리적 자국일 뿐이며, 이 자국은 응시자의 상상 속에서 다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롤랑 바르트는 이러한 사진을 사르트르의 개념을 빌려 응시자의 상상과 기억을 자극하는 상상적 매개물로서 아날로공(analogon)이라고 했다.
상징적 매개물로서의 아날로공(analogon)과 능동적 상상
사진의 아날로공은 사진을 다른 매체와 구별시키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면서 응시자로 하여금 열려진 프래그머티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주체-관객에 의해 진행되는 사진의 프래그머티즘은 기억의 환유적 확장을 통해 마치 무생물에 영혼의 입김을 불어 생명을 소생시키듯이 일종의 기억소생술과 같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진의 비주얼 리터러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것 역시 바로 이러한 기억의 환유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사진은 그 생성과정에서 문화적으로 텅 비어 있는 의미 상자이면서 화면의 흰 여백(blanc)이기 때문이다.
주체-관객의 관점에서 사진은 응시자로 하여금 학습된 장치의 해석학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음악의 즐거움처럼 심연에 잠재된 기억의 파편을 자극하기도 한다. 바르트가 자신의 책 『밝은 방』에서 푼크툼(punctum)을 장면의 주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섞은 이빨과 구두끈 등으로 설명하듯이, 우리는 전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심연의 기억들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한다. 지하철 광고 모퉁이에 한복으로 곱게 차려 입은 여인의 주름에서, 누군가 카톡으로 보낸 환히 웃는 소녀의 얼굴에서, 어느 블로그 사진에 나타난 뜰에 핀 봉선화에서 어렴풋한 기억의 이중인화를 목격하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상파와 인터넷 그리고 페이스 북과 같은 SNS 영상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엄청난 정보들, 특히 사진으로 소통되는 많은 장면들은 무기력한 기억 간섭으로 모든 것을 무감각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 결국 이미지 읽기의 주체상실과 무감각은 사진의 또 다른 문맹을 보여준다. 아무리 하찮은 사진일지라도, 아무리 진부한 주제라도 자신의 기억과 욕구가 투영되는 순간, 이미지는 생명의 빛으로 소생되어 자신의 기억이 되고, 현실이 되고, 희망이 된다. 사진에서 비주얼 리터러시는 탈-구조와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주체-관객의 능동적인 상상에 달려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사진은 결코 해석이 아니다.
'기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25호] 건축, 건축학, 그리고 우리의 건축학 연구 (0) | 2013.06.12 |
|---|---|
| [125호] 현대무용은 오늘날 몸문화, 몸사상의 이상적 구현체 (0) | 2013.06.12 |
| [125호] 21세기 음악연구, '음악학'의 경계를 넘어 (0) | 2013.06.12 |
| [125호] 현대미술의 교양은 상아탑 바깥에서 (1) | 2013.06.12 |
| [124호] 불안, 제약이자 가능성 (0) | 2013.04.15 |